▶ Interview
함께 만들어가는
평범한 캠퍼스 생활
전은혜 교육속기사 (서울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장애학생의 교육 지원을 위해 캠퍼스 곳곳을 다니는 전은혜 속기사는 그 ‘다양성’의 현장을 일상에서 체감한다. 누군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할지 모른다. 하지만 전은혜 속기사에게 타인은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이자 함께 성장하는 동료이며, 자신을 일으켜주는 선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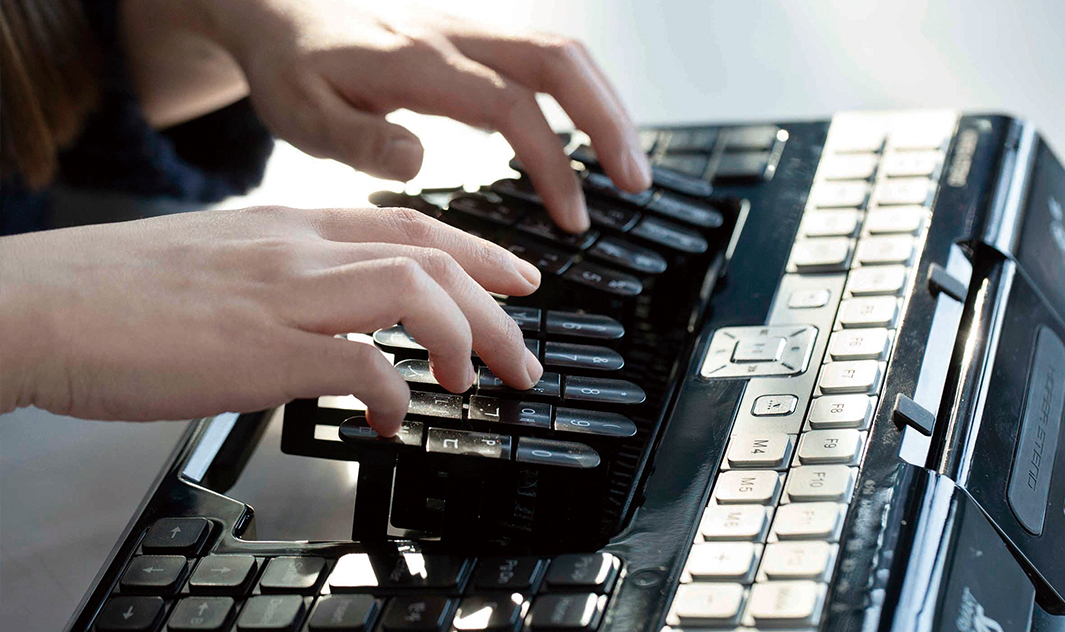
배움의 열의를 속기로 지원합니다
캠퍼스에서 만난 전은혜 속기사의 한 손에는 커다란 여행용 가방이 들려 있었다. 그 안에는 속기계와 노트북, 각종 수업 자료가 들어 있다. 장애학생의 속기 지원에 필요한 장비들이다. 서울대학교는 국립대학으로는 최초로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학업 지원도 주요 지원 사항 중 하나다. 전은혜 속기사는
학기가 시작되면 담당학생과 함께 강의 현장에 동행한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자도서 제작 봉사를 하다가 속기를 처음 알게 됐어요. 자원봉사와 자격증 공부를 병행하면서 2015년 국가공인 속기사가 됐습니다.”
당시 봉사처는 시각·청각·지체장애인을 지원하는 기관이었다. 그곳에 다니는 장애인들은 배움을 이어가기 위해 자연스럽게 학습 보조를 받았다. 시청각장애인의 보조기기에 문자 통역을 하면서 ‘속기’라는 재능이 다른 이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꼈다. 지방의회에서 회의 속기록을 작성한 적도 있었지만, 그를 속기사의
길로 이끈 ‘교육’에 대한 생각이 마음 한편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렇게 2016년부터 서울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를 통해 장애학생 교육 지원에 나섰다.
AI가 대체할 수 없는 공존의 영역
대부분 청각장애인인 담당학생은 그가 실시간으로 작성하는 속기록을 보고, 수업을 따라간다. 속기록에는 교수의 강의 내용은 물론 강의실 분위기도 담긴다.
“속기사는 단순히 빠르게 타이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특히 대학의 교육속기사는 강의 분위기는 물론 반어법이나 표정, 행동까지 전달하며 학생들이 원활하게 캠퍼스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요. 다만 분위기는 전달하되 뉘앙스를 제가 해석해서 전달하지는 않아요. 개개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추어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공자도 어려운 강의 내용을 빠르게 파악하는 일은 교육속기사의 숙명이다. 일반적인 속기 현장은 여러 명의 속기사가 번갈아가며 속기록을 작성하지만, 대학교 강의는 특성상 실시간 속기를 교대 없이 수행해야 한다. 장시간 강도 높은 속기를 해야 하지만, 자신의 속기록을 보고 공부할 담당학생들을 생각하면 집중력이 흐트러질
새가 없다.
‘속기사님 덕분에 졸업했다’며 감사를 전하는 학생들과의 소통은 교육속기사이기에 경험할 수 있는 보람이다. 기나긴 코로나19 팬데믹 동안에도 진심이 닿은 소통은 멈추지 않았다. 이러한 교감은 기계는 할 수 없는 인간의 영역이다. 이러한 경험을 녹여낸 전은혜 속기사의 수기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콘텐츠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장애학생의 ‘학습’을 위한 방법을 고민하며
학기가 시작하면 담당학생은 달라진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전은혜 속기사’를 지정해달라는 요청이 늘었다. 매 학기 짝꿍처럼 캠퍼스에서 동행하는 담당학생들은 소중한 동행자이자, 선생이다.
“강의실에 들어가면 ‘한 팀’처럼 움직입니다. 전공 내용을 가장 잘 아는 건 학생이니까, 정확한 표현을 물어보기도 하고요. 담당학생이 저에게는 제일 중요한 선생인 셈이죠.”
동행하기 어려운 실기수업에는 원격 마이크를 단 인형을 담당 학생에게 들려 보낸다. 질의응답이나 토론 시간에 ‘마이크에 대고 말해 달라’는 무언의 부탁을 귀여운 인형에 담아 전하는 것이다. 그가 교육속기사로서 가장 집중하는 목표는 ‘장애학생들의 학습’이다. 그렇게 고민하며 몰두하다 보니 교육속기사로서의 자신도
성장했다.
“처음 서울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에 왔을 때 작성한 속기록과 최근 속기록을 비교해보면 이렇게 발전했나 싶어 저도 놀랄 때가 있어요. 각자 전공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진로를 찾아가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어느덧 서울대학교에서 교육속기사로 활동한 지 8년째. 그런데도 여전히 새 학기가 시작되면 새 친구를 만날 생각에 마음이 들뜬다. 그런 그의 소박한 바람 하나는 ‘할머니가 될 때까지 교육속기사로 일하는 것’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구분하지 않고 여유롭게 소통하는 세상 안에서, 할머니 속기사가 캠퍼스를 누비는
날을 상상해본다.